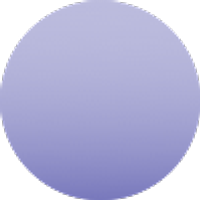이재명 무료 카지노 게임 by 권성동 13p
 이재명 망언집 by 권성동
이재명 망언집 by 권성동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 증대입니다. 기업이 사회의 필요성을 반영해 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 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사회적 기여에는 항상 이익 추구가 함께합니다.
물론, 특정 기업에서 아픈 아이를 위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작은 컵 시리얼을 출시한 일도 있습니다. 이는 기업의 다수 이익 추구 활동 중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사회 환원을 선택한 경우이기에 예외적이고 기업의 활동 수를 수량적으로 봤을 데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.
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가 대표적인 기업의 철학이자 기업의 행동에 대한 해석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.
이와 비교해서 제대로 된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집단입니다.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분야 학자가 장관을 하기도 하고 군인 출신으로 사병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국방을 담당하기도 합니다.
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국익을 우선하는 정부 사이 그 주도권은 정부가 갖는 것이 더욱 많은 이들을 위한 공익을 위해 도움 될 것입니다. 게다가 그냥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'적법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'로 한정합니다.
유권자들이 올바른 절차를 수호할 선출직들을뽑는다면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오히려 이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요소요소에 위치하신 분들이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기에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.
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당연히 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근거로 할 때,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상적인 부분만 고려한다면 '적법성을 가지지 못한 부분'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가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의 회장이 큰 결정권을 갖는 것과 비교할 때, 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절차를 요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 관여할 것이며,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 위치에 가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 자원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-처음 접하는 내용에 대한 연상을 진솔하게 기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퇴고하지않습니다.